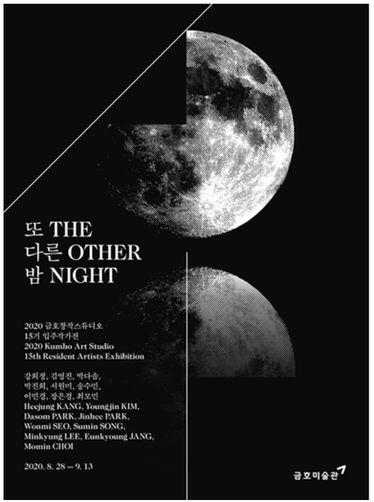갇히려는 자의 장르, 회화 글_ 양효실 30대 후반 (남성)화가 최모민의 작업은, 자신이 보기에는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는 매체/형식인 회화를 그럼에도 계속 한다는 것, 지금 자신이 하는 ‘이’ 회화에 대한 것이다. 자기-지시적 회화인 듯 보인다. 그는 일은 낮에 하고 작업은 “밤과 새벽에” 한다. 배경은 그가 살고 산책하고 관찰하고 사진으로 담고 작업실에서 재구성하는 “연희동 홍제천 부근 저개발 지역 이전에는 할머니 집이었던 작업실 주변 혹은 홍제천 산책로 밤풍경”이다. 동네 풍경은 그가 말할 것처럼 “개와 늑대의 시간”에 맞춰져 언캐니하게 (재)구성된다. 개와 늑대가 분간이 안 되는,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어스름한 시간에 사물과 풍경은 재현성을 상실하고 대신에 모호하고 혼성적인 것으로, 불길하고 불안한 것으로 전치된다. 보고 판단하는 자의 시선이 불가능한 시간은 사물과 풍경이 비로소 말하는 시간이다. 작가는 자신의 경제적 물리적 조건인바 이런 시간, 이런 풍경에 충실하다. 하니 그런 시간에 갇혀 있다.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는 그런 조건을 살아야 하는 불리한 인간이다. 할머니 집이 있는 동네, 그가 화가로서 살아내는 시간이 그렇다. 그 시간에 그는 사물과 풍경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자신의 회화는 “현대 미술”이나 “진보적 언어”가 아니라 “장르”일 뿐이라고 조용히 말할 때, 유일무이한 예술이나 보편적 언어로서의 회화가 아닌, 이제 더는 할 것도 없을만큼 박제화되고 제도화되고 일종의 ‘키치’가 된 회화가 자신에게 도착한 동시대 회화라고 말할 때, 우리는 대신에 껍데기로 남아 바스락거리는 회화의 ‘잔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회화-하기의 하찮음을 인정한다. 그는 좀 더 래디칼하고 진보적인 언어로 갈아타지 않았고, 자신의 낡은 매체의 불리함을 인정하였고, 그러므로 저개발 지역 풍경과 하나의 장르로서의 회화의 자리에 앉기를 선택했다―이것은 선택인가. 도시에 남은 풍경은 자연이라 부르기 뭐한 사물이다. 남은 것이고 도시인과 교환가능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그 자체로 모호한 것이다. 홍제천 부근과 같은 곳은 이미 그 자체 언캐니한 것이다. 그런 여전히 남아 있는 장소와 여전히 작동하는 형식을 결합하는 퍼포먼스/수행은 가치와 의미에서 거의 소진된 내부, 텅 빈 내부로서의 장소와 형식의 접합이라는 점에서 밋밋한 무위(無爲)이다. 행하지만 행함이 없는 이런 수행은 굳이 예술이라는 매체의 한계를 빼고 보면 그 자체 ‘미적’이다. 벗겨진 후광이나 잊혀진 이름 너머에서야 비로소 일어나는 수행들은 그렇다.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한계를 극복하기 보다는 그것을 무위의 반복으로 재전유하는 것, 남은 자에게 주어진 유희에의 명령에 충실하는 것은 결국 내부가 비워지고 말라버린 껍질처럼 바스락거리는 형식에서 길어 올릴 어떤 은유, 상징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증명할 것이다. 말라버린 늪에 바늘 없는 낚싯대를 드리우는 자는 늘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텅 빈 제스쳐의 반복을 통해 삶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뒤바꿔버렸다. 그런 하기, 살기, 겪기, 남기. 이번 전시에 작가는 연작과 연작을 내놓았다. 작품 제목은 모두 동사적 상태를 함축한다. 화면에 늪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작고 적은 장소가 등장한다. 화면의 중앙에 배치된 늪(포식자의 은유)은 빠뜨리고 허우적거리게하고 빨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력한 느낌이다. 비가 와서 움푹하니 패인 곳에 고인 물 같은 이 늪과 늘 작가의 화면에 등장하는 풍경 사이에서 동일인물일 듯 한 둘 셋의 사내가 옷을 벗고 있거나 늪을 응시하거나 이쪽을 바라본다. 재현적 서사의 이해불가능성은 그들이 몸소 자처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들은 순차적 시간의 절단면들처럼 배치되어 있다. 이미 늪에 빠진 이, 이쪽으로 등을 보이고 마저 옷을 벗고 있는 이, 막 상의를 벗기 시작한 이, 늪에 슬쩍 배치된 나무 의자. 물 웅덩이 속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인물과 웅덩이 속 이미지의 시선은 살짝 어긋나 있다.( 연작 중 7) 그들은 자기반영적이지 않다. ‘거울상’은 늪 바깥의 자신이 아닌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배경의 숲을 반복하는 녹색 옷을 입은, 그러므로 식물의 확장이자 일부인 이 남자는 우물이 아닌 ‘늪’에 자신을 비춰보고 있다. 작가의 화면 속 ‘얼굴’은 살아있는 인격이라기 보다는 그림자-반영에 가깝다. 그는 유령-환영-이미지 같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늪을 중심으로 한 세 사람의 행위의 시간적 순서를 ‘발견’하려고 할 것이지만 불가능하다. 다른 화면에서는 이제 손에 녹색을 묻힌/손이 녹색인 남자는 늪에 들어간 채 이곳을 보고 이전 화면보다 시간상으로 더 나가 있다( 연작 중 6>. 슬쩍 보이는 ‘얼굴’은 표정이 없다. 그들은 이곳에 들어가야/빠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거나 복종하는 것 같다―풍경은 이 불가해한 상황에 목격자인가, 방관자인가? 그(들)은 자살인지 박해인지 명령인지 ‘행위’인지 동의인지 사라짐인지 모를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거의 모든 은유가 공존하는 ‘개과 늑대의 시간’에서 빠져나오려할 것이다. 작가는 역방향으로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공존하는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 자이다. 왜 세 여성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누워 있는 사내를 위에서 바라보며 뭔가를 하고 있는가?( 연작 중 8> 이 단면은 어떤 이야기의 파편이고 알레고리인가? 어떤 이야기에도 맞춰지지 않는 파편을 나도 몇 개는 갖고 이승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다. 그것은 실재인가, 환영인가, 누가 내게 묻힌 얼룩인가? 꿈 같다. 꿈은 내가 꾼 것인지 누가 나 대신 꾼 것인지 모른다고도 한다. 꿈은 그런 발신자와 수신자의 분리불가능함을 전제로 나를 학대하고 나를 매혹한다. 꿈은 나이를 모르고 장소를 모르고 어디서건 나를 바탕으로 자신을 지속한다. 연작 중 역시 상의를 벗고 이쪽으로 등을 보이면서 ‘매달린’ 인물(연작 중 8)은 상징적으로 딛고 있는 아파트와 알레고리적으로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렇게 그려진 것인지,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읽을 수 없는, 읽기를 거부하는 화면 앞에서 우리는 계속 이런저런 읽기를 시도하고 있게 된다. 저개발 지역에 사는 30대의 남성에게 아파트란 현실로서 인용될 것이지만 그것은 단지 그의 ‘풍경’ 속 밋밋하고 시시한 이미지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는 운동을 하는 것인지 떨어지려는 것인지 매달리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을 가시화한다. 캔버스에 유화로 옮기기전 수없이 습작, 연습을 거치는 작가의 이번 회화는 특히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거킨 브러시스트로크를 통해 그려진 질감을 강하게 드러낸다. 슥슥 그려진 겨울 나무들과 역시나 꿈처럼 여기저기에 흔적으로 배치된 사내의 발들은 이곳이 논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빠질 수 없는 늪처럼 매달릴 수 없는 나뭇가지를 붙드는 사내의 이 무익하고 무의미한 행위는 그렇기에 오직 시각성을 통해 우리를 화면에 빠지게 하고 매달리게 한다. 비슷한 구조의 거미줄을 디딤돌/줄 삼아 균형을 유지하는 인물의 상황도 모호하다( 연작 중 7). 그는 거대한 거미줄에 갇힌 것인지 그 거미줄을 의지처 삼아 ‘건너려는/넘어가려는’ 것인지 식별불가능하다. 이러한 모호성이 작가의 ‘일관된’ 화면, 풍경, 구성이다. 5개의 탁구채는 떨어지는 순간들의 시간적 단면들인 듯 연쇄를 이루고, 4개의 탁구공과 한 개의 반숙 계란 프라이가 왼쪽 면을 차지한 겨울 풍경 속 매달린 남자와 그를 돕는 남자는 역시 다른 화면들처럼 동일인물일 것 같다(연작 중 6). 5개의 탁구채는 논리적으로 서사적으로 안 맞고, 심지어 슬쩍 계란 프라이는 농담같다. 오직 나무에 매달리다, 늪에 들어간다라는 수행성 외에는 어떤 것도 의미화되지 않는 이런 텅 빈 행위 앞에서 우리는 계속 논리적 (불)가능성과 심리적 긴장과 유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보이는 것은 행위이거나 단지 몇 개의 붓질이거나 (시간적)서사를 무화하려는 신중한 구성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남은 회화에 대한 것이다.